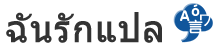- ข้อความ
-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1950년대 전후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고뇌를 그리고 있는 김동
1950년대 전후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고뇌를 그리고 있는 김동리의 소설 의 한 구절이다. “밀다원”이라는 다방에서 각자의 삶에 대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뇌하는 예술가들의 모습. 이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전쟁으로 인해, 생존조차 위태로웠던 지식인들에게 다방은 위로의 공간이자, 현실도피처이자, 새로운 창작의 공간이였다. 문학가 뿐만 아니라 시인, 영화인들까지 다방으로 모여들어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러한 다방 문화는 충무로와 명동을 중심으로, 1970-80년대 까지 그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갔다. 다방문화는 그 시대의 정서와 당시 젊은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잘 보여준 다는 점에서 문화사적으로 그 의의가 남다르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개념을 넘어서서 서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담론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 카페의 변천사
이러한 카페문화는 사회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50년대의 다방문화도 1896년 아관파천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맛본 후, 덕수궁에 돌아와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에서 서양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에서 출발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한 모습이였다.
1970년 대에는 다방에 처음으로 DJ가 등장하면서 음악다방이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맨 사람들이 다방에 모여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다. 장발머리를 하고 느끼한 멘트를 서슴없이 날리던 잘 생긴 DJ들은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부럽지 않았으리라. 최근 20대들에게도 기성세대의 문화에 공감하게 했던 ‘세시봉’만 보아도 이 때의 낭만적인 음악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알 수 있다. 1980년 대로 접어 들면서도 청춘들의 다방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이 공간은 혁명을 꿈꾸던 청년들의 민주항쟁을 탄생시키게 해준 공간으로 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커피의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방의 손님은 줄어들게 된다. 굳이 다방에 오지 않아도 자판기나 커피믹스를 통해 쉽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였다.
1990년 대에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수요가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지금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커피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화적 기호가 다양해 지면서 단순히 프림 두스푼과 설탕 두스푼만 들어간 밀크커피가 전부였던 다방은 몰락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커피 메뉴의 다양성에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싼 커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커피전문점이 갖춰야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카페의 고급화는 2000년대로 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점점 더 커피보단 커피전문점의 이미지를 중시하게 되었다. 고급스러운 커피 전문점의 많은 등장은 답답한 도서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대학생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였다. 이제 우리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과제를 하거나 두꺼운 전공서적을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너무나 자주, 쉽게 볼 수 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등장은 카페도 도서관 처럼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자 욕구를 만들어 냈고, 이 욕구에 맞춰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북카페’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서재에 온듯 벽면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책들을 보고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숙하게 된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북카페 역시 그냥 자기 공부에 몰두해있는 대학생들로 넘쳐났다. 조금은 시끌벅적한 일반카페보다 조용하고 방해하는 이 없으니 공부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일테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스터디 카페’라는 명칭을 가진, 이름부터 정말 공부를 해야하는 카페임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다방으로 부터 변화해온 카페는 이제 서로 담론을 나누고 소통하던 개방적인 공간에서 점점 폐쇄적이고 개인주의 적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 카페의 변천사
이러한 카페문화는 사회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50년대의 다방문화도 1896년 아관파천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맛본 후, 덕수궁에 돌아와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에서 서양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에서 출발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한 모습이였다.
1970년 대에는 다방에 처음으로 DJ가 등장하면서 음악다방이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맨 사람들이 다방에 모여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다. 장발머리를 하고 느끼한 멘트를 서슴없이 날리던 잘 생긴 DJ들은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부럽지 않았으리라. 최근 20대들에게도 기성세대의 문화에 공감하게 했던 ‘세시봉’만 보아도 이 때의 낭만적인 음악문화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알 수 있다. 1980년 대로 접어 들면서도 청춘들의 다방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이 공간은 혁명을 꿈꾸던 청년들의 민주항쟁을 탄생시키게 해준 공간으로 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커피의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면서 다방의 손님은 줄어들게 된다. 굳이 다방에 오지 않아도 자판기나 커피믹스를 통해 쉽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였다.
1990년 대에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수요가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지금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커피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화적 기호가 다양해 지면서 단순히 프림 두스푼과 설탕 두스푼만 들어간 밀크커피가 전부였던 다방은 몰락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커피 메뉴의 다양성에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싼 커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커피전문점이 갖춰야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카페의 고급화는 2000년대로 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점점 더 커피보단 커피전문점의 이미지를 중시하게 되었다. 고급스러운 커피 전문점의 많은 등장은 답답한 도서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대학생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였다. 이제 우리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과제를 하거나 두꺼운 전공서적을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너무나 자주, 쉽게 볼 수 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등장은 카페도 도서관 처럼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자 욕구를 만들어 냈고, 이 욕구에 맞춰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북카페’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더불어 서재에 온듯 벽면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책들을 보고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숙하게 된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북카페 역시 그냥 자기 공부에 몰두해있는 대학생들로 넘쳐났다. 조금은 시끌벅적한 일반카페보다 조용하고 방해하는 이 없으니 공부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일테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스터디 카페’라는 명칭을 가진, 이름부터 정말 공부를 해야하는 카페임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다방으로 부터 변화해온 카페는 이제 서로 담론을 나누고 소통하던 개방적인 공간에서 점점 폐쇄적이고 개인주의 적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0/5000
ในปี 1950 หลังสงครามความปวดร้าวสำหรับชีวิตของศิลปิน และนวนิยายคิมดองวอนลีเป็นหนึ่งในข้อพระคัมภีร์ >< โรงงานยุคนี้ "ข้าวสาลีชนะ" เป็น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ชีวิตของแต่ละคนในห้องว่า สงครามมจริงอย่างจริงจังเกี่ยวกับศิลปินดิ้นรน นี้แสดงดีจริงของนวนิยายสามารถเห็นส่วนหนึ่ง เนื่องจากสงคราม อยู่รอดคือเดิมพัน แม้แต่ปัญญาชนตรงพื้นที่ตอนนี้ 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 มันเป็นพื้นที่สร้างสรรค์ใหม่สำหรับหลบภัย คนอย่างตัวอักษร กวี ภาพยนตร์รวบรวมเป็นห้องขึ้นเพื่อ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ชุมชน และ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 วัฒนธรรมกาแฟเหล่านี้เป็นศูนย์กลาง บริเวณเมียงดง งมู 1970-80 จนเขาก็ออกไป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เวลาของการเยี่ยมชมของหนุ่มอารมณ์ และแสดงในความละเอียดอ่อน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เขาเป็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คือแข็งแกร่งกว่าที่เคย เพียงแค่ผู้ดื่มกาแฟเกินกว่าแนวคิดของแต่ละสังคม 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ในวาท 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สามารถทำดินปั๊มของเขาเอง#. คาเฟ่ ' sวัฒนธรรมเหล่านี้คาเฟ่เป็นปรับให้เข้ากั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การไหลของสังคม เยี่ยมชมของการ ' 50s และหลบภัยที่ legation รัสเซียใน 1896 กระดาษเคืองรัสเซีย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 legations กาแฟลิ้ม แล้วกลับมา 'เงินบริจาค' ของศาลเจ้ารวมอาหารที่เรียกว่าแบบตะวันตกที่อยู่รวมตัวกันของตะวันตกเพลงและเครื่องดื่มกาแฟดูให้เหมาะสมกับยุคสมัยแตกต่างจากที่เห็นครั้งแรกในปี 1970 ดีเจ มีห้องดนตรีที่นำไปสู่ความมั่งคั่ง สวมใส่กางเกงยีนส์ให้กับผู้รวบรวมในห้องอคูสติกกีต้าร์ขอ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ตนเอง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 ผมยาวหัวและอนุสาวรีย์ไฟ nalrideon รู้สึกสวย DJ ไอดอลกลุ่มนี้มีไม่ไม่อิจฉาพวกเขา วัฒนธรรมสุดท้าย 20 สงสารเห็นใจรุ่นเก่ามี ' CECI ฉัน "เพลงโรแมนติกวัฒนธรรมจึงความรู้สึกในหมู่คนหนุ่มสาว ในปี 1980 ยังของเยาวชนเป็นตัวตรง รักเปลี่ยนไม่พื้นที่นี้กบฏ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ของคนหนุ่มสาวที่คุณได้รับการฝันของการปฏิวัติสำหรับฉันพัฒนาไปลงในช่องว่าง แต่ปลาย ' 80 มีคนกล่าวว่า การเจาะของร้านเหล่านี้ท่านกาแฟจะลดลง ถ้าคุณกล้าที่จะทำ japangina มาแฮงค์เอ้าท์กาแฟผสมทำให้ การดื่มกาแฟของคุณได้ครบในปี 1990 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 'การ 'สำหรับถ้วยชงกาแฟ saenggyeonamyeonseo เป็นครั้งแรก ตอนนี้คุ้นเคยนัก' ร้านกาแฟ' การเริ่มต้น สัญลักษณ์ต่าง ๆ 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เป็นเพียงไปเท่าสองช้อนชาของน้ำตาลกับสองช้อนชากาแฟนมพริมแวลทั้งหมดถูกบังคับให้ประกาศการตายของอาณาเขตเดิม นอกจาก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เมนูค่อนข้างแพงกาแฟ กาแฟเริ่มจะออกมาในบรรยากาศทันสมัย และหรูหราร้านเป็นองค์ประกอบหลักที่สำคัญนี้นำไปสู่ยุค 2000 ใหม่คาเฟ่ ท่านจะได้รับเพิ่มเติม และเพิ่มเติมเน้นภาพลักษณ์ของร้านกาแฟมากกว่ากาแฟ ของร้านกาแฟหรูหราจะต้องคัดไปเป็นห้องสมุดของวิทยาลัยนักเรียนสนใจดึงรอยเท้าของ ตอนนี้เรากำลังนั่งอยู่ในคาเฟ่กำหนดหรือหนังสือสำคัญแล็ปท็อปหนากระจายบ่อยเกินไป นักเรียน เห็นด้วย ศึกษาวิทยาลัยนักเรียน 'คาเฟ่' จุติในคาเฟ่เรียกว่าเป็นเงียบไลบรารีไม่ 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ผู้บริโภค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นี้ การสร้างครั้งแรกเป็นขวา 'bugkape' บรรยากาศหรูหราเต็มไป ด้วยสวนกำแพง sanctorum ถ้ำแนบหนังสือ และดูฉันเงียบ ซึ่งแตกต่างจาก bugkape ชื่อด้วย แต่เป็นการศึกษาในนักศึกษา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เป็นเรื่องน้ำท่วม มันเป็นบิตเงียบวุ่นวายทั่วไป ของร้าน และไม่รบกวนการศึกษานี้เนื่องจากรูปแบบตอนนี้ชื่อ 'ศึกษา Cafe' ควรชื่อ กับการแสดงที่ดีที่เป็นจริงจากการศึกษาจะเกิดพื้นที่ใหม่ในคาเฟ่ของ ทุกอย่างมี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จากคาเฟ่ตอนนี้ มีตัวหารเป็นการ สื่อสารของวาทกรรม พื้นที่ว่างในการปิดมากขึ้น และกลายเป็นช่องว่างสำหรับปัจเจก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ในความปวดร้าวเกี่ยวกับชีวิตของศิลปินรอบปี 1950 และเป็นหนึ่งในทางเดินของนวนิยายเรื่องนี้คิมตง-Ni <กระแทกได้รับรางวัลระยะเวลาที่> "วงกลมกระแทก" ว่าสำหรับชีวิตของพวกเขาในร้านกาแฟภาพของศิลปินดิ้นรนอย่างจริงจัง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สงคราม นิยายเรื่องนี้เป็นส่วนหนึ่งที่คุณสามารถดูดีที่แสดงให้เห็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ร่วมสมัย เพราะสงครามและแม้กระทั่งการอยู่รอดที่ถือหุ้นสำหรับปัญญาชน wotdeon คาเฟ่พื้นที่ขึ้นและหลบห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ห้อง yiyeotda สำหรับสร้างใหม่ จากวรรณกรรมเช่นเดียวกับกวีผู้สร้างภาพยนตร์ที่รวมตัวกันในร้านกาแฟ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ชุมชนและ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 วัฒนธรรมร้านกาแฟรอบ Chungmuro และเมียงดงยังคง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ป 1970-1980 ของ วัฒนธรรมคาเฟ่เป็นความสำคัญพิเศษใ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ความไว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ในการที่จะแสดงให้เห็นว่าวัยหนุ่มสาวในช่วงเวลาของอารมณ์และความดี เพียงแค่เกินแนวคิดพื้นที่ที่ได้ดื่มกาแฟในที่หลบภัยของตัวเองเพื่อพูดคุยเกี่ยวกับวาทกรรม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สังคมกับแต่ละอื่น ๆ . #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 Cafe ของวัฒนธรรมร้านกาแฟนี้ได้รั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เพื่อให้พอดีกับการไหลของสังคม วัฒนธรรมคาเฟ่ของ '50s แม้เมื่อปี ahgwanpacheon 1896 Gojong สองรัฐ yiyeotda ที่เริ่มต้นจากกาแฟลักษณะดื่มในขณะที่ฟังดนตรีตะวันตกในการที่อาคารสไตล์ตะวันตก jeonggwanheon และลิ้มรสกาแฟครั้งแรกในสถานทูตรัสเซียกลับมาที่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 Deoksugung เพื่อให้เหมาะกับเวลาในปี 1970 ปรากฏตัวครั้งแรกของเขาในฐานะดีเจที่ Cafe จะนำไปสู่ความมั่งคั่ง Cafe เพลง กีตาร์อะคูสติใส่กางเกงยีนส์คนคนรวมตัวกันที่ร้านกาแฟชอบดอกไม้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อง และดีเจหล่อหัวผมยาวปูนซีเมนต์เลี่ยนอยู่ในขณะนี้โดยไม่ต้องลังเลกลุ่มไอดอลจะ nalrideon] ไม่ [มีความอิจฉา เท่านั้น 'sesibong' ซึ่งจะยังช่วง 20 วัยรุ่นเห็นอกเห็นใจต่อ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คนรุ่นเก่าจะได้รู้ yeoteulji รับรู้วัฒนธรรมดนตรีโรแมนติกเป็นสิ่งที่มันหมายสำหรับคนหนุ่มสาวในเวลานี้ ขณะที่เราป้อนปี 1980 เป็นเยาวชนมีความรักของร้านกาแฟไม่มียังเปลี่ยนพื้นที่ที่มีการพัฒนาเป็นพื้นที่ที่ก่อให้เกิด haejun เกิดของการลุกฮือขึ้นต่อต้า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ของคนหนุ่มสาวฝันของการปฏิวัติ แต่ในช่วงปลายยุค 80 'เข้าสู่เจาะขนาดใหญ่มากขึ้นของกาแฟก็จะลดลงในร้านกาแฟบุคคลทั่วไป Yiyeotda เพราะ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สามารถแม้แต่จะมาถึงร้านกาแฟ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ผ่านเครื่องหรือผสมกาแฟสามารถเพลิดเพลินกับกาแฟหยอดเหรียญเริ่มโผล่ออกมาว่าข้อเรียกร้อง 'ร้านกาแฟ' เกิดขึ้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ขณะนี้ที่คุ้นเคยให้กับนักเรียนในขณะที่มีสำหรับปี 1990 เอสเพรสโซ ' เป็นเพียงสองช้อนโต๊ะน้ำตาลและนมเพียงสัญลักษณ์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ศาลฎีกา jimyeonseo สองช้อนโต๊ะลงในร้านกาแฟกาแฟถูกบังคับทั้งหมดที่จะประกาศความหายนะ เริ่มโผล่ออกมาเป็นกาแฟที่ค่อนข้างมีราคาแพง, 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เมนูกาแฟเป็นบรรยากาศเก๋และหรูหราที่เหมาะสมได้รับการสถาปนาตัวเองเป็นองค์ประกอบสำคัญเพื่อให้แน่ใจว่าพวกเขามีร้านกาแฟ. ความซับซ้อนของคาเฟ่แห่งนี้ตามมาด้วยปี 2000 คนกลายเป็นความสำคัญมากขึ้นในรูปของกาแฟมากกว่าร้านขายกาแฟ หลายร้านกาแฟสุดหรูปรากฏ yiyeotda เป็นที่น่าสนใจเพียงพอที่จะดึงดูดนักศึกษาที่ต้องการจะออกไปจากเท้ากดขี่ของห้องสมุด ตอนนี้เราจะเห็นได้ว่านักเรียน kyeonotgo แล็ปท็อปนั่งอยู่ในร้านอาหารหรือสถานที่ที่จะศึกษา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สาขาวิชาหนังสือเล่มหนามากเกินไปมักจะได้อย่างง่ายดาย การเกิดขึ้นของ "นักเรียนที่เรียนในร้านกาแฟ 'ถูกดึงเพื่อสร้าง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ผู้บริโภคที่ฉันหวังว่าคาเฟ่ยังเงียบสงบเป็นห้องสมุดเป็น" จอง Cafe "ที่ปรากฏเป็นครั้งแรก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 เมื่อฉันเห็นหนังสือที่เต็มไป ondeut รอบผนังในถ้ำที่มีบรรยากาศที่หรูหราผมไม่เจตนาจะกลายเป็นที่เงียบสงบ แต่แตกต่างจากชื่อและหนังสือร้านกาแฟก็ยังเต็มไปด้วยนักเรียนที่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ศึกษาด้วยตนเอง บิตที่มีเสียงดัง Teda เนื่องจากมี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สำหรับการศึกษา eopeuni เป็นที่เงียบสงบและรบกวนกว่า Cafe ปกติ. ดังนั้นตอนนี้เราจะเกิดมาแม้กระทั่งการศึกษาชื่อ Cafe 'ที่จะมีจำนวนมากของพื้นที่ใหม่จริงๆแสดงร้านกาแฟที่คุณต้องการที่จะเรียนรู้จากชื่อเรียกว่า คาเฟ่คาเฟ่ได้รับตอนนี้เปลี่ยนจาก byeonhaegago ของพื้นที่ปิดและปัจเจกมากขึ้นในการเปิดพื้นที่ถูกแบ่งออกในการสื่อสารกับแต่ละวาทกรรมอื่น ๆ
การแปล กรุณารอสักครู่..


ภาษาอื่น ๆ
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ครื่องมือแปลภาษา: กรีก, กันนาดา, กาลิเชียน, คลิงออน, คอร์สิกา, คาซัค, คาตาลัน, คินยารวันดา, คีร์กิซ, คุชราต, จอร์เจีย, จีน, จีนดั้งเดิม, ชวา, ชิเชวา, ซามัว, ซีบัวโน, ซุนดา, ซูลู, ญี่ปุ่น, ดัตช์, ตรวจหาภาษา, ตุรกี, ทมิฬ, ทาจิก, ทาทาร์, นอร์เวย์, บอสเนีย, บัลแกเรีย, บาสก์, ปัญจาป, ฝรั่งเศส, พาชตู, ฟริเชียน, ฟินแลนด์, ฟิลิปปินส์, ภาษาอินโดนีเซี, มองโกเลีย, มัลทีส, มาซีโดเนีย, มาราฐี, มาลากาซี, มาลายาลัม, มาเลย์, ม้ง, ยิดดิช, ยูเครน, รัสเซีย, ละติน, ลักเซมเบิร์ก, ลัตเวีย, ลาว, ลิทัวเนีย, สวาฮิลี, สวีเดน, สิงหล, สินธี, สเปน, สโลวัก, สโลวีเนีย, อังกฤษ, อัมฮาริก, อาร์เซอร์ไบจัน, อาร์เมเนีย, อาหรับ, อิกโบ, อิตาลี, อุยกูร์, อุสเบกิสถาน, อูรดู, ฮังการี, ฮัวซา, ฮาวาย, ฮินดี, ฮีบรู, เกลิกสกอต, เกาหลี, เขมร, เคิร์ด, เช็ก, เซอร์เบียน, เซโซโท, เดนมาร์ก, เตลูกู, เติร์กเมน, เนปาล, เบงกอล, เบลารุส, เปอร์เซีย, เมารี, เมียนมา (พม่า), เยอรมัน, เวลส์, เวียดนาม, เอสเปอแรนโต, เอสโทเนีย, เฮติครีโอล, แอฟริกา, แอลเบเนีย, โคซา, โครเอเชีย, โชนา, โซมาลี, โปรตุเกส, โปแลนด์, โยรูบา, โรมาเนีย, โอเดีย (โอริยา), ไทย, ไอซ์แลนด์, ไอร์แลนด์, การแปลภาษา.
- 比喻无本领的冒充有本领,次货冒充好货。
- 因为头是高器官
- เป้าหมายในอนาคตของฉันมีอยู่ 2 อย่าง คือ
- Ask people to select sentences
- I'm on my way
- Cross-Cultural Team Opportunities and Ch
- ในแก้วใบสั้นมีพื้นที่น้อย
- Hey Alice, look down. There's a scumbag
- Une agitation qui atteint son paroxysme
- nice pic
- forever yours
- ever
- Pray
- i can't do it.
- อุบัติเหตุที่มีสาเหตุมาจากพฤติกรรมที่ไม่
- เขียน
- ขอให้มีความสุข
- Excuse
- ดี
- Whether you want the perfect hairstyle f
- ดี
- I worked as an IT officer
- 俏姑娘
- the cutting elements are welded to the s